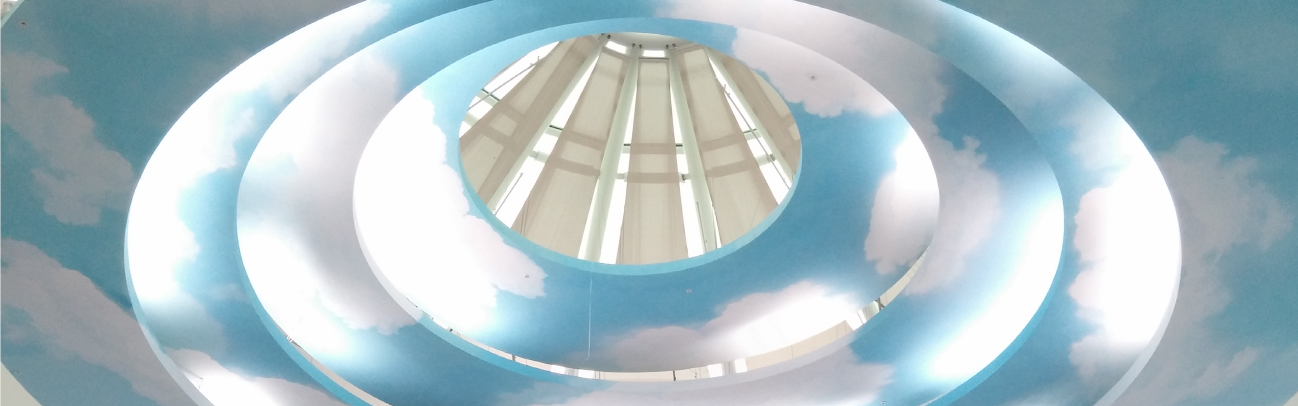2011. 4. 9
주말 오후에 차를 끌고 나오는게 아니었다. 몇 년 만에 엠티 따라간답시고 오지랖을 부리는 바람에 제대로 자지도 못했는데 그래도 태어나서 처음 맞는 서른번째 생일을 앞두고 스스로 준비한 생일선물 여행을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다. 출발 한시간 전까지 망설이긴 했지만 이미 계획된 일이었고 사전에 연락을 취해둔 사람들도 있으니 그대로 진행할 수 밖에 없다. 운전에 익숙해졌다고 아무리 합리화 해봐도 내 덩치에 suv는 좀 무리스럽긴 하다. 이런 몽롱한 정신으로 운전대를 잡는 건 사실 범죄에 가까웠다. 그래도 대한민국이 발급해 준 면허도 있고 술도 마시지 않았으니 객관적으로는 아무 문제될 것 없는 상황이었다.
해지기 직전에 출발했지만 고속도로에 진입하자마자 금세 어둑어둑해져버렸다. 평균 시속 35km의 속도는 좀 많이 어중간했다. 이건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것만 못하다. 아 졸려.... 까딱 잘못해서 정신줄 놨다가는 큰맘 먹고 출발한 여행이고 뭐고 렌트한 차에 스크래치내고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게 생겼다. 대책없는 인생이다.
아직 휴게소 들어가려면 한참 남았는데 졸리다 못해 졸도해버릴 것 같다. 앞서가는 차의 후미등과 브레이크등이 정신을 교란시킨다. 살짝 토할 것 같은 느낌도 든다. 정말 답이 안나온다.
노래라도 들으면 좀 나을까 싶다. 자극적이지 않지만 각성에 꽤 효과가 있는 곡으로 치자면 심성락 연주곡만한 것들이 없다. 아코디언의 음색이 졸지마라고 경고를 해준다. 고마울 따름이다. 하필 이럴때 혼자 여행이라니. 조수석에 누구 하나라도 앉아 있었더라면 얘기라도 두런두런 해가면서 어떻게든 겨우겨우 갈 수 있을듯 했다.
이대로는 도저히 안되겠다. 지금은 누구라도 사람의 목소리와 단 몇마디라도 나눠야 위기를 모면할 수 있겠다. 생존은 중요하다. 전화번호 몇 개를 꾹꾹 눌러보지만 토요일 저녁에는 다들 바쁠수 밖에 없다. 어 나야. 나 운전 중인데 너무 졸려서 그냥 걸어봤다. 야, 안돼!!! 빨리 휴게소 들어가!!! 사고나면 어떡할라고!!! 대본을 읽어내리듯 판에 박힌 대화가 몇차례 오고간다. 사고나면 어떡할라고. 그래 나도 알지. 근데 휴게소가 넘 멀다구. 휴게소 들어갔으면 내가 전화했겠냐. 한숨밖에 안나온다.
그때 어쩌자고 너에게까지 전화를 한 것인가. 제정신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여보세요'
'어 나야. 잘지내니?'
운전 중인데 휴게소는 너무 멀고 너무 졸리다고 하지 않았다.
'회사는 왜 그만 뒀어요?'
'뭐? 니가 그걸 어떻게 알어? 내가 얘기했었나???'
앞뒤 잘라먹고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바람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뭔가 변명이라도 해야 할 지경이었다.
'지난 번에 얘기했잖아요. 회사그만뒀다고.'
'그러니까 그걸 언제 얘기했냐고. 아 뭐지? 뭐 살다보면 사람이 이럴수도 있고 저럴수도 있는거야.'
좀더 세련된 말들이 필요했지만 이미 혼미해진 정신에 그럴 경황이 없다. 그냥 좀 나만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고. 기분전환도 필요하다고. 그런 연후에야 사람이 살다보면 이럴수도 있고 저럴수도 있는거라고 말했어야 했다. 그리고 나서는 그냥 안부가 궁금해서 걸어봤다고 잘지내라고 하고 끊었어야 했다.
'내가 좀 정리가 안되긴 하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들어. 무슨 말인지 이해안되도 되묻지 말고 알아서 들어. 내가 좀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긴 한데, 니가 보고싶은 거 같아. 근데 그게 진짜 보고싶은건지 아니면 그냥 잠깐 그런건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계속 생각해볼꺼야. 그러니까 앞으로 한 달, 아니 반년정도 지나도 계속 보고싶으면, 그러니까 잠깐 그런게 아니면 한 번 좀 봐도 될까? 아 뭐 당연히 니가 괜찮으면 보는거지.'
툭 뱉어놓고도 너무 해괴망측해서 어디 숨어버리고 싶지만 달리는 차 안에서, 그것도 운전 중에 가능한 일은 아니었다.
'저... 교환학생가요. 다음 학기에'
대화에 ABCD가 없다. 징검다리 건너듯 띄엄띄엄 이게 무슨 짓인가.
'뭐? 교환학생? 어디로?'
'페루요.'
'뭐? 페루? 거기 남미아냐?'
'저도 잘 몰라요. 그냥 우리나라보다 한참 못사는 나라래요.'
'야 그래도 그렇게 말하면 안돼. 세상 어딜가도 다 배울게 있는거야. 더군다나 너 지금 교환학생 가는거라며. 그럼 배우러 가는거잖아.'
'네 뭐 그렇긴해요.'
'그래. 그럼 영어만 하지 말고 그 나라 말도 좀 배우고 잘 지내다 오면 되지. 근데 얼마나 있다 오는데?'
'2년 뒤에 와요.'
'뭐? 2년이나? 언제가는데?'
'7월이나 8월쯤에 갈거예요.'
2년. 당황스러운 기간이다. 한학기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2년이라니.
안그래도 머리 속이 뒤죽박죽인데 정신이 하나도 없다.
불현듯 성냥불이 탁 켜지듯 생각나는 것이 있다.
'참, 너 여자친구가 뭐래? 그렇게 2년씩이나 그렇게 멀리 간다는데 뭐라고 안해?'
그게 왜 궁금한데? 미친 게 분명하다. 말이 입 밖으로 나온다고 다 말이 아니라구.
'여자친구랑 같이 가요. 양가 허락 받았어요.'
양가 허락 받았어요.
양가 허락 받았어요.
난 무슨 짓을 한걸까. 정말 미치지 않고서야 도대체 왜 이러고 있는거야. 이제 그만 멈춰야 된다. 나도 그걸 안다.
'아 그렇구나. 잘 됐네. 멀리 혼자 가 있는 것보다 둘이 가면 외롭지는 않겠다. 다행이네.'
'네. 그렇겠죠.'
미친년. 별 지랄을 다 한다. 이 무슨 낯뜨거운 오지랖이냐.
'누나'
'어, 말해. 하고 싶은 말 있음 해.'
'.....................'
'말 하려다가 안하고 뜸들이면 궁금하잖아.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도 되.'
'.........아니예요.'
'어. 그래. 뭐 하기 싫으면 안해도 되.'
말은 오고가지만 어떻게 수습할 방법은 없고 어색함에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럼 이제 연락한다고 안할거지?'
'.....'
'대답해.'
'네..'
'그래. 그럼 이걸로 정리하자.'
'네..'
'잘 살아라.'
'네..'
그때 마지막으로 네가 나에게 하려했던 말은 내가 듣고 싶었던 말은 아니었겠지.
'막 지어낸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해님 달님 별님 (0) | 2012.07.09 |
|---|---|
| 누나의 일기장(6) (0) | 2012.06.08 |
| 누나의 일기장(4) (0) | 2012.06.03 |
| 누나의 일기장(2) (0) | 2012.06.02 |
| 가위(1) (0) | 2012.0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