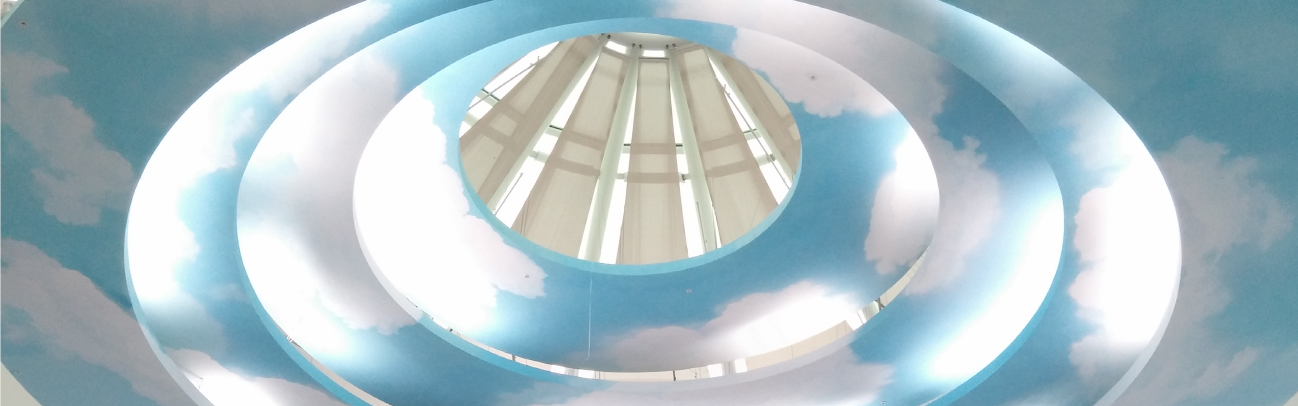2012. 2. 21
'지은아'
이름 석자 불러주었을 뿐이었는데 순간 세계는 재구성되었다.
나는 가던 길을 멈추고 메시지를 확인하다 그 조그만 화면에 내 이름이 그렇게 턱하니 던져져있다는 것에 흠칫 놀라 누가 '아이스케키'라고 하며 치마라도 들춘 마냥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내가 생각해도 내 뺨따구가 너무 후끈거려 민망하기 그지 없어 그 짧은 순간 동안에 걷는 속도를 늦추고 앞뒤좌우를 살폈다. 당연히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다. 그저 나 혼자만 인식한 새계의 재구성. 햇빛의 색깔이 착, 하고 반짝거렸다 멈추었고 저 앞에서 나를 향해 흘러오던 공기들이 움찔, 하면서 주춤거렸다. 발을 딛고 있던 땅도 살짝- 아주 살짝 꾸궁하고 내려 앉았다 제자리로 돌아왔다. 땡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서 다른 층에 도착한 것 같은 새로운 세계와의 만남.
아직까지 그로부터 단 한번도 지칭되지 않았던 이름이었다. 우리라는 표현을 쓰기도 어색한 그와의 사이에서 우리는 굳이 서로를 부를 필요가 없었다. 그냥 말을 걸면 대답을 하고 바쁘면 놓치고 지나가는 그런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그냥 그 정도 거리의 사람.
그는 확인했다.
'내가 너를 지은이라고 부른적이 있나? 실제로'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었다. 만약 그랬었다면 그 순간 세계가 재구성되는 미묘한 흔들림을 느끼지 않았겠지. 그 진동은 시작이자 처음을 알리는 거였다. '한 번도 불림당한적 없는 것 같은데요' 나는 기억을 쥐어짜낼 필요도 없이 단호한 뉘앙스로 대답할 수 있었다.
그저 흔한 이름이었다. 다만 최근에 특별해졌다면 누구나 다 아는, 대중의 사랑을 듬뿍받는 유명 연예인의 본명과 같아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자체 신상털기를 해보아도 내 개인에 대해서는 찾아낼 수 없는 그 흔해빠진 이름 석 자. 뭐 별 볼 것도 없는 그 이름 석 자가 어느 순간 특별한 개체가 되어 버린 것이다.
'지은아'
여물먹는 동물처럼 다시 끄집어내어 반추해보았지만 아까와 같은 울림은 없다. 내 스스로 내 이름을 부르는 행위는 특별할 것이 없었다.
'지은아'
또 한 번 시도해 보았지만 역시나 마찬가지였다. 내가 내 이름을 되새김질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자고로 이름이란 것은 누가 불러주었을 때만 비로소 그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것이 이름의 정체성이었다.
나는 이 상황이 어색하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뜬금없어서 확인하기로 했다.
그는 갑자기 그냥 생각이 났다고 했다. 자신이 나를 불러보거나 먼저 말을 걸었던 적이 한번도 없었던 것이 생각났다고 했다. 그러나 생각이 났다는 건 좀 말이 안됐다. 생각이란 것은 있었던 일이나 상황에 대한 기억인 것인데, 예컨데 내가 매번 먼저 너에게 말을 걸곤 했다. 라고 생각하거나 기억해낼수는 있어도, 나는 너에게 먼저 말을 걸어본 적이 없다. 라고 기억해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는 지금 발생하지도 않았던 일에 대해 생각이 났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다.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때가 되어 잠자리에서 일어났는지, 점심을 먹었는지, 오늘 누군가와 약속이 있는지를 궁금해 하는 것과는 아주 다른 성질의 것이다. 기억의 구성. 수동적이지만 나의 세계의 재구성은 그의 기억의 구성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나의 새로운 세계는 창조된 것이 아니라 구성된 것이다.
2012. 2. 22
고등학교까지의 정규 교육을 무난히 마쳐 놓고 이제서야 생각이 났다.
바로 문제의 발단이자 원인이자 해설서인 김춘수의 '꽃'.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香氣)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 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어떤 법칙이 절대적이려면 그의 역도 성립해야 하는 법이다. 이 독한 시는 피아를 바꾸어도 성립이 되고만다. 이름이란 그런 것이다. 없는 꽃도 만들어 내는 것이 이름인게다.
세계가 재구성 된 그 순간, 나는 그 세계의 프레임에 갇혀버렸다.
'막 지어낸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해님 달님 별님 (0) | 2012.07.09 |
|---|---|
| 누나의 일기장(6) (0) | 2012.06.08 |
| 누나의 일기장(4) (0) | 2012.06.03 |
| 누나의 일기장(3) (0) | 2012.06.02 |
| 가위(1) (0) | 2012.0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