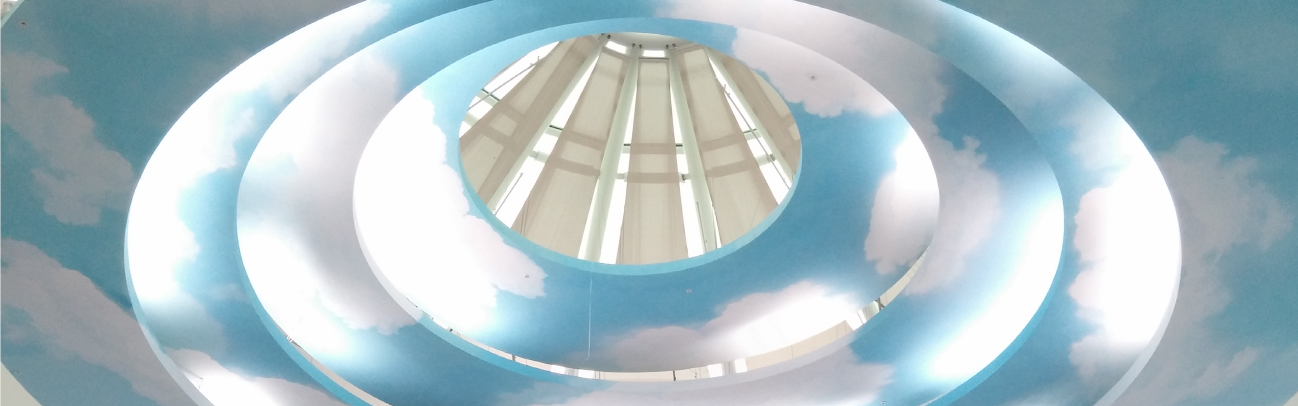가위
어느 언덕배기 동네 중턱즈음에 조그만 의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평범한 동네 내과라 계절이 바뀌는 어느 날은 콧물이 줄줄 흐르는 아이들로 북적댔고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어느 날은 그전날 찬 것을 많이 먹어 배탈이 난 사람들이 끊임없이 드나들었죠.
그래도 일년 365일 매일 바쁜 병원은 아니었는데요, 환자가 뜸한 날 점심 무렵이면 어김없이 병원 문 밖에 조그만 팻말이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기억을 잘라 드립니다'
아니, 미용실도 이발소도 아니고 머리를 잘라 주는 것도 아니고 기억을 잘라 준다니요?
이 팻말이 나붙은 날은 일주일에 며칠, 한달에 몇 번, 이렇게 정해진 것도 아니었고 언제가 그날일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알고 있다면 그 조그만 의원의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 정도일까요? 그리고 그 팻말은 상당히 작아서 유심히 눈여겨 보지 않으면 팻말이 붙었는지도 모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많지 않은 그런 날에는 어김없이 붙어 있었지요.
때는 봄날입니다. 꽃가루가 풀풀 날리는 때도 살짝 지났고 덥지도 춥지도 않은 그런 봄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점심을 먹고 자기 자리에 앉아서-그 자리가 어디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살짝 졸린 눈을 끔뻑끔뻑 거리고 있습니다. 언덕배기 중턱의 그 동네병원 앞에 왠 아가씨가 천천히 걸어오다 섰습니다. 아가씨인지 아줌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길지도 짧지도 않은 생머리가 어깨 길이만큼 내려오고, 뚱뚱하지도 마르지도 않은 체격에 오른손에는 점심 식사 후 디저트로 마신듯한 테이크아웃 음료 컵을 들고 있네요. 그냥 아가씨라고 하려구요. 아가씨는 발걸음을 천천히 옮기다 병원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흐읍-하고 숨을 들이쉬고 병원 문을 살짝 밀고 들어갑니다.
"어서오세요. 저희 병원 진료 처음이신가요?"
"저..밖에.."
"네? 아- 문 앞에 붙은 팻말보고 들어 오셨어요?^^ 저희 병원 진료 처음이시면 환자 카드 간단하게 작성해 주시면 접수해드릴게요."
아가씨는 약간 머뭇거립니다. 간호사 선생님은 익숙하다듯이 안내를 합니다. 대기실에 다른 환자는 없습니다. 길 가로 난 제법 큰 창으로 햇빛이 따뜻하다 싶게 들어옵니다. 아이보리보다는 조금더 노랗고 달걀 노른자보다는 조금 연한 그런 햇빛입니다. 환자 대기실의 소파는 그보다 조금 더 짙은 베이지 색입니다. 창틀로는 종류가 다른 화분이 네 개, 아니 조그만 선인장까지 다섯 개 있습니다. 건조하지도 습하지도 않은 실내입니다. 소리가 들릴락말락하게 음악이 흐릅니다. 클래식 같기도 경음악 같기도 한 피아노와 바이올린 곡입니다. 제목은 기억나지 않지만 생소한 곡은 아닙니다.
아가씨는 약간은 긴장한듯, 처음이라 어색한듯 소파에 무릎을 모으고 앉아 천천히 시선을 옮기다 이따금 손에든 음료를 마십니다. 커피인지 허브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컵이 투명하지 않은걸로 봐서 레모네이드나 아이스티는 아니지 싶습니다.
잠시 후 간호사 선생님이 아까와 같은 말투로 안내합니다.
"진료실로 들어가세요.^^"
간호사 선생님의 목소리는 밝고 명랑하지만 빠르거나 산만하지 않습니다. 눈웃음이 살짝 드리워 목소리와 얼굴만으로는 나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하얀 얼굴과 반팔 유니폼이 늘 실내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티가 나는 정도입니다.
아가씨는 대답대신 고개를 살짝 끄덕이고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발자국 소리가 나지 않을만큼 살짝살짝 발걸음을 떼며 진료실로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의사선생님이 가볍게 웃으며 인사합니다. 차트를 보거나 모니터 화면을 보며 인사하는 여느 선생님과는 조금 달라 보입니다. 목소리는 높지도 낮지도 않고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습니다. 차분하다 정도가 어울리겠네요.
아가씨는 아직 긴장이 풀리지 않은듯 가볍게 침을 꼴딱 삼키면서 이번에도 대답대신 고개를 끄덕여 인사하고 천천히 진료실 문을 닫습니다. 그러고는 의사선생님 책상 옆 동그란 의자에 앉았습니다.
의사선생님이 먼저 말문을 엽니다.
"오늘 날씨 괜찮죠? 이런 날은 병원도 조금 한가하거든요. 환자분은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선생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합니다. 여선생님인데 화장은 거의 한듯안한듯 하고 테없는 안경너머로 크지 않은 눈이 현명해보이는 인상입니다. 차가워보이거나 날카로워 보이는 인상은 아닙니다.
"저... 기억을..."
아가씨는 크지 않은 목소리로 어렵사리 말문을 엽니다.
"편하게 말씀하시면 되요. 어디가 불편하신지 자세히 말해주시면 저로서도 큰 도움이 되거든요."
선생님은 여전히 차분합니다. 이 병원 안에 어색한 사람은 아가씨뿐인가 봅니다. 아가씨는 무슨 말을 하려는듯 마려는듯 입술을 움직거립니다. 선생님은 아가씨와 눈을 맞추고는 살짝 미소를 띕니다. 자세히 보니 선생님의 귀밑머리와 구렛나루에는 흰머리도 제법입니다. 간호사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언뜻 봐서는 나이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아가씨는 아직 말문을 열지 못하고 시선을 아래로 떨어뜨리며 양손 검지손가락을 맞붙이고 꼼지락 거립니다. 아직 1분도 지나지 않았는데 꽤 오랜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가씨가 말문을 열려면 좀 더 기다려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느 언덕배기 동네 중턱즈음에 조그만 의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평범한 동네 내과라 계절이 바뀌는 어느 날은 콧물이 줄줄 흐르는 아이들로 북적댔고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어느 날은 그전날 찬 것을 많이 먹어 배탈이 난 사람들이 끊임없이 드나들었죠.
그래도 일년 365일 매일 바쁜 병원은 아니었는데요, 환자가 뜸한 날 점심 무렵이면 어김없이 병원 문 밖에 조그만 팻말이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기억을 잘라 드립니다'
아니, 미용실도 이발소도 아니고 머리를 잘라 주는 것도 아니고 기억을 잘라 준다니요?
이 팻말이 나붙은 날은 일주일에 며칠, 한달에 몇 번, 이렇게 정해진 것도 아니었고 언제가 그날일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알고 있다면 그 조그만 의원의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 정도일까요? 그리고 그 팻말은 상당히 작아서 유심히 눈여겨 보지 않으면 팻말이 붙었는지도 모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많지 않은 그런 날에는 어김없이 붙어 있었지요.
때는 봄날입니다. 꽃가루가 풀풀 날리는 때도 살짝 지났고 덥지도 춥지도 않은 그런 봄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점심을 먹고 자기 자리에 앉아서-그 자리가 어디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살짝 졸린 눈을 끔뻑끔뻑 거리고 있습니다. 언덕배기 중턱의 그 동네병원 앞에 왠 아가씨가 천천히 걸어오다 섰습니다. 아가씨인지 아줌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길지도 짧지도 않은 생머리가 어깨 길이만큼 내려오고, 뚱뚱하지도 마르지도 않은 체격에 오른손에는 점심 식사 후 디저트로 마신듯한 테이크아웃 음료 컵을 들고 있네요. 그냥 아가씨라고 하려구요. 아가씨는 발걸음을 천천히 옮기다 병원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흐읍-하고 숨을 들이쉬고 병원 문을 살짝 밀고 들어갑니다.
"어서오세요. 저희 병원 진료 처음이신가요?"
"저..밖에.."
"네? 아- 문 앞에 붙은 팻말보고 들어 오셨어요?^^ 저희 병원 진료 처음이시면 환자 카드 간단하게 작성해 주시면 접수해드릴게요."
아가씨는 약간 머뭇거립니다. 간호사 선생님은 익숙하다듯이 안내를 합니다. 대기실에 다른 환자는 없습니다. 길 가로 난 제법 큰 창으로 햇빛이 따뜻하다 싶게 들어옵니다. 아이보리보다는 조금더 노랗고 달걀 노른자보다는 조금 연한 그런 햇빛입니다. 환자 대기실의 소파는 그보다 조금 더 짙은 베이지 색입니다. 창틀로는 종류가 다른 화분이 네 개, 아니 조그만 선인장까지 다섯 개 있습니다. 건조하지도 습하지도 않은 실내입니다. 소리가 들릴락말락하게 음악이 흐릅니다. 클래식 같기도 경음악 같기도 한 피아노와 바이올린 곡입니다. 제목은 기억나지 않지만 생소한 곡은 아닙니다.
아가씨는 약간은 긴장한듯, 처음이라 어색한듯 소파에 무릎을 모으고 앉아 천천히 시선을 옮기다 이따금 손에든 음료를 마십니다. 커피인지 허브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컵이 투명하지 않은걸로 봐서 레모네이드나 아이스티는 아니지 싶습니다.
잠시 후 간호사 선생님이 아까와 같은 말투로 안내합니다.
"진료실로 들어가세요.^^"
간호사 선생님의 목소리는 밝고 명랑하지만 빠르거나 산만하지 않습니다. 눈웃음이 살짝 드리워 목소리와 얼굴만으로는 나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하얀 얼굴과 반팔 유니폼이 늘 실내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티가 나는 정도입니다.
아가씨는 대답대신 고개를 살짝 끄덕이고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발자국 소리가 나지 않을만큼 살짝살짝 발걸음을 떼며 진료실로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의사선생님이 가볍게 웃으며 인사합니다. 차트를 보거나 모니터 화면을 보며 인사하는 여느 선생님과는 조금 달라 보입니다. 목소리는 높지도 낮지도 않고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습니다. 차분하다 정도가 어울리겠네요.
아가씨는 아직 긴장이 풀리지 않은듯 가볍게 침을 꼴딱 삼키면서 이번에도 대답대신 고개를 끄덕여 인사하고 천천히 진료실 문을 닫습니다. 그러고는 의사선생님 책상 옆 동그란 의자에 앉았습니다.
의사선생님이 먼저 말문을 엽니다.
"오늘 날씨 괜찮죠? 이런 날은 병원도 조금 한가하거든요. 환자분은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선생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합니다. 여선생님인데 화장은 거의 한듯안한듯 하고 테없는 안경너머로 크지 않은 눈이 현명해보이는 인상입니다. 차가워보이거나 날카로워 보이는 인상은 아닙니다.
"저... 기억을..."
아가씨는 크지 않은 목소리로 어렵사리 말문을 엽니다.
"편하게 말씀하시면 되요. 어디가 불편하신지 자세히 말해주시면 저로서도 큰 도움이 되거든요."
선생님은 여전히 차분합니다. 이 병원 안에 어색한 사람은 아가씨뿐인가 봅니다. 아가씨는 무슨 말을 하려는듯 마려는듯 입술을 움직거립니다. 선생님은 아가씨와 눈을 맞추고는 살짝 미소를 띕니다. 자세히 보니 선생님의 귀밑머리와 구렛나루에는 흰머리도 제법입니다. 간호사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언뜻 봐서는 나이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아가씨는 아직 말문을 열지 못하고 시선을 아래로 떨어뜨리며 양손 검지손가락을 맞붙이고 꼼지락 거립니다. 아직 1분도 지나지 않았는데 꽤 오랜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가씨가 말문을 열려면 좀 더 기다려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막 지어낸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해님 달님 별님 (0) | 2012.07.09 |
|---|---|
| 누나의 일기장(6) (0) | 2012.06.08 |
| 누나의 일기장(4) (0) | 2012.06.03 |
| 누나의 일기장(3) (0) | 2012.06.02 |
| 누나의 일기장(2) (0) | 2012.06.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