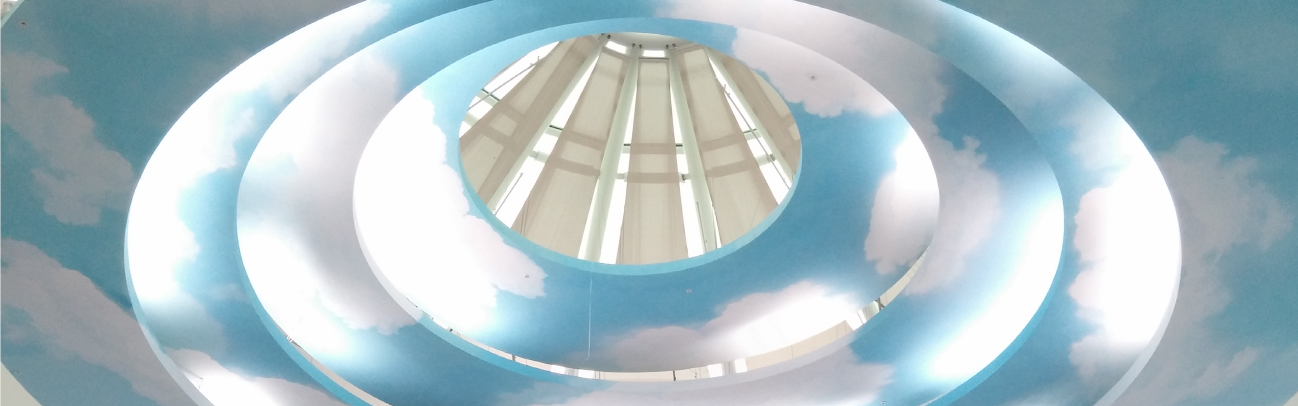오늘처럼 살짝 우중충한 주말 아침에도
빈둥빈둥거려도 기분은 보송보송해지는그런 글 한 줄 남겨야겠다.
불안불안하고 어둡고 슬프고 축축하고 아슬아슬한 그런 글말고
담담하고 어둠속에서도 한 줄기 빛이 되고 슬픔을 어루만지고 장마철에도 잘 마른 수건처럼 흡족하며 덜컹거리는 버스 안에서도 평온한 그런 글
엄마는 평소와 다름없이 부엌에서 김치볶음밥을 하다가 '오늘은 좀 깜깜하네'하며 형광등을 탁-켜니 고소한 참기름 냄새와 환한 빛이 살금살금 내 방으로 걸어 들어왔다. 뭐 이런 글
우울을 팔아먹지 않아도
슬픔의 비밀을 폭로하지 않아도
과거를 울궈먹지 않아도
과도하게 분노하고 절규하지 않아도
충분히 글로서 자격이 있지 않은가.
묵묵하고 꿋꿋하고 우직한 글 한 단락 정도는 있어도 괜찮지 않겠는가.
김치볶음밥 다 되었다. 아침 먹으러 가자!
빈둥빈둥거려도 기분은 보송보송해지는그런 글 한 줄 남겨야겠다.
불안불안하고 어둡고 슬프고 축축하고 아슬아슬한 그런 글말고
담담하고 어둠속에서도 한 줄기 빛이 되고 슬픔을 어루만지고 장마철에도 잘 마른 수건처럼 흡족하며 덜컹거리는 버스 안에서도 평온한 그런 글
엄마는 평소와 다름없이 부엌에서 김치볶음밥을 하다가 '오늘은 좀 깜깜하네'하며 형광등을 탁-켜니 고소한 참기름 냄새와 환한 빛이 살금살금 내 방으로 걸어 들어왔다. 뭐 이런 글
우울을 팔아먹지 않아도
슬픔의 비밀을 폭로하지 않아도
과거를 울궈먹지 않아도
과도하게 분노하고 절규하지 않아도
충분히 글로서 자격이 있지 않은가.
묵묵하고 꿋꿋하고 우직한 글 한 단락 정도는 있어도 괜찮지 않겠는가.
김치볶음밥 다 되었다. 아침 먹으러 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