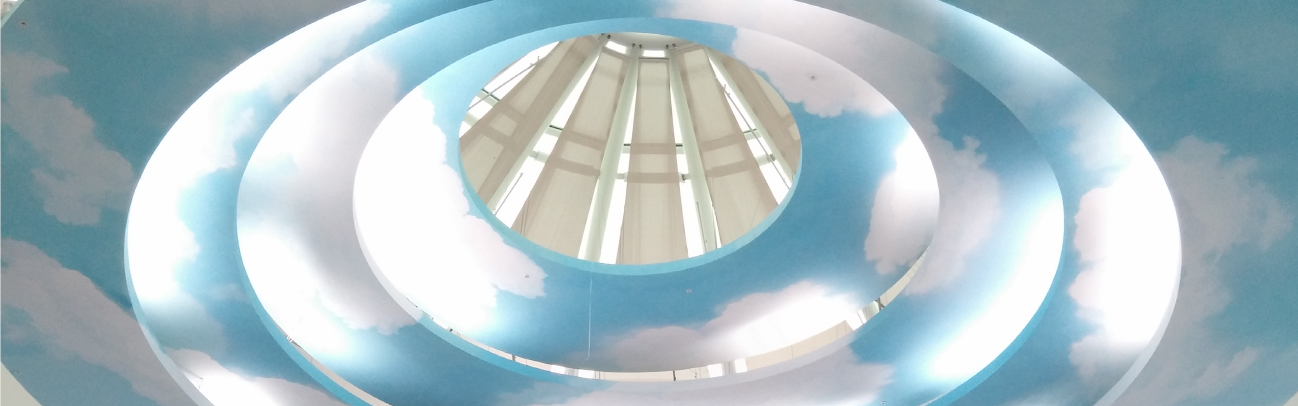참으로 다행이었다.
변변치 못했던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고작 몇 푼 안되는 떡볶이 순대 이 정도 시시껄렁한 분식의 값을 치루는 정도였는데, 그 마저도 핀잔을 받았던 비루한 시간들. 너의 입술은 예쁘장하고 매력적이었지만 그 사이를 비집고 나오는 내용은 천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리적으로 불합리하지 않았으니 나는 크게 잘못한 것도 없이 한마디 대꾸조차 하지 못하고 모멸감을 감수했다.
내용과 형식은 잘 가려봐야 한다. 우리는 종종 이와 같은 형식을 태도라고 한다. 모두 다 맞는 말이었다. 틀린 구석이 하나도 없었지만 어떤 말은 상처를 만들고 또 어떤 말은 빈말이라도 사람을 감싸주었다.
말의 위력을 알게 되면 외경하게 되고 그러면 자연히 말수는 줄어들게 마련이다. 가벼움을 가벼움으로 맞받아쳐 똑같은 수준의 인간이 되는 것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어차피 인간의 무게야 이래나 저래나 육십억 분의 일 정도 될까말까 하니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말이 말을 낳고 그 말이 또 말을 낳아 말 끼리는 서로를 책임질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 문제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이다.
어느 순간부터인지 몰라도 말의 꽃이 말의 잔치가 되고, 말의 잔치가 축제가 되더니 눈 두 개 귀 두 개 입 하나 달린 사람 너도나도 그 축제를 즐기게 되자 축제가 끝나고는 쓰레기만 남아 버렸다. 누구는 남아서 청소를 하고 또 누군가는 공연히 굴러다니는 빈 병을 툭툭 발로 차고 다닌다.
나는 등에 망태기를 걸러 메고 양손에는 손바닥이 빨간 투박한 목장갑을 끼고 한 손에는 딱딱 소리가 나는 집게를 쥐고서 안개속으로 끝도 보이지 않는 대로를 이리 저리 왔다 갔다 하며 빈 병을 주워 담으며 비맞은 무엇처럼 중얼거린다. 별 같잖지도 않은 것들이 놀기는 오지게 잘 놀아 놓고 오만상 추접게 해놓았구나. 뒷정리는 늘 고된 일이지만 해놓고 나면 개운한 것을 잘 알고 있어서 즐거운 마음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할 뿐이다.
변변치 못했던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고작 몇 푼 안되는 떡볶이 순대 이 정도 시시껄렁한 분식의 값을 치루는 정도였는데, 그 마저도 핀잔을 받았던 비루한 시간들. 너의 입술은 예쁘장하고 매력적이었지만 그 사이를 비집고 나오는 내용은 천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리적으로 불합리하지 않았으니 나는 크게 잘못한 것도 없이 한마디 대꾸조차 하지 못하고 모멸감을 감수했다.
내용과 형식은 잘 가려봐야 한다. 우리는 종종 이와 같은 형식을 태도라고 한다. 모두 다 맞는 말이었다. 틀린 구석이 하나도 없었지만 어떤 말은 상처를 만들고 또 어떤 말은 빈말이라도 사람을 감싸주었다.
말의 위력을 알게 되면 외경하게 되고 그러면 자연히 말수는 줄어들게 마련이다. 가벼움을 가벼움으로 맞받아쳐 똑같은 수준의 인간이 되는 것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어차피 인간의 무게야 이래나 저래나 육십억 분의 일 정도 될까말까 하니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말이 말을 낳고 그 말이 또 말을 낳아 말 끼리는 서로를 책임질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 문제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이다.
어느 순간부터인지 몰라도 말의 꽃이 말의 잔치가 되고, 말의 잔치가 축제가 되더니 눈 두 개 귀 두 개 입 하나 달린 사람 너도나도 그 축제를 즐기게 되자 축제가 끝나고는 쓰레기만 남아 버렸다. 누구는 남아서 청소를 하고 또 누군가는 공연히 굴러다니는 빈 병을 툭툭 발로 차고 다닌다.
나는 등에 망태기를 걸러 메고 양손에는 손바닥이 빨간 투박한 목장갑을 끼고 한 손에는 딱딱 소리가 나는 집게를 쥐고서 안개속으로 끝도 보이지 않는 대로를 이리 저리 왔다 갔다 하며 빈 병을 주워 담으며 비맞은 무엇처럼 중얼거린다. 별 같잖지도 않은 것들이 놀기는 오지게 잘 놀아 놓고 오만상 추접게 해놓았구나. 뒷정리는 늘 고된 일이지만 해놓고 나면 개운한 것을 잘 알고 있어서 즐거운 마음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할 뿐이다.
'막 지어낸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귤 냄새 (0) | 2012.08.14 |
|---|---|
| 삼일장(1) (0) | 2012.07.13 |
| 해님 달님 별님 (0) | 2012.07.09 |
| 누나의 일기장(6) (0) | 2012.06.08 |
| 누나의 일기장(4) (0) | 2012.06.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