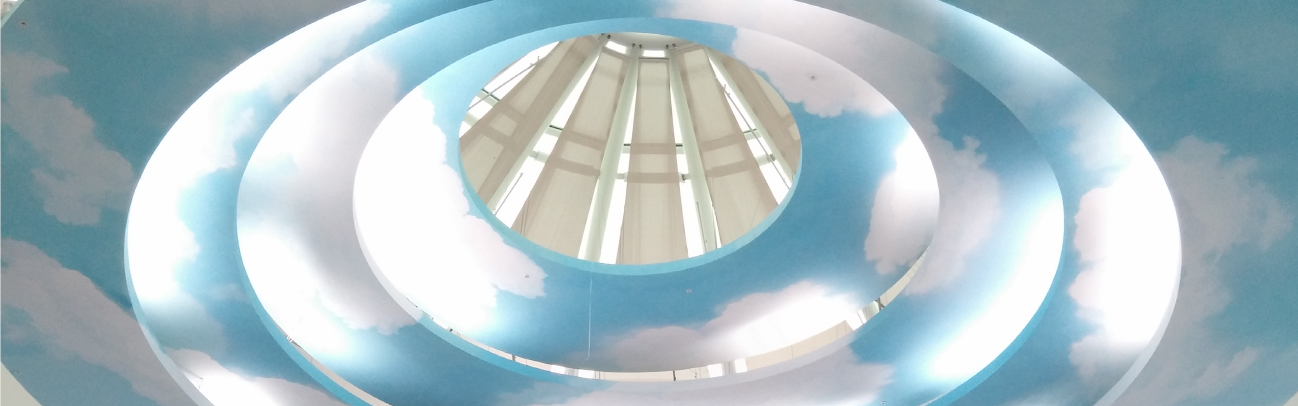뚝 떨어진 아침 공기와 팔짱끼고
종종걸음으로 출근하여
시린 손 부벼가며 데워먹는 호박죽 한 그릇은
내게 너무 과분한 것
어두컴컴한 책상 밑에서
빠알간 눈 지긋이 내리깔고
내 두 다리를 지켜보는 작달만한 온열기도
내게 너무 과분한 것
퇴근길 양 가로에 빽빽히 줄 서서
노란 컷트머리 흔드는 은행나무 발치에
툭 툭 떨어져 으개지고 짓뭉개져 구리구리한 은행도
내게 너무 과분한 것
누군가의 심혈로 쓰였을 짤막한 시 한 줄을
지하철 광고판 보듯 흘겨보는 일도 내겐 너무 과분하고
한 사람이 필기감이 다른 펜을 바꿔가며 쓴 듯한
젊은 작가들의 밋밋한 단편소설을 읽는 것도 내겐 너무 과분하다.
몸 둘 바를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