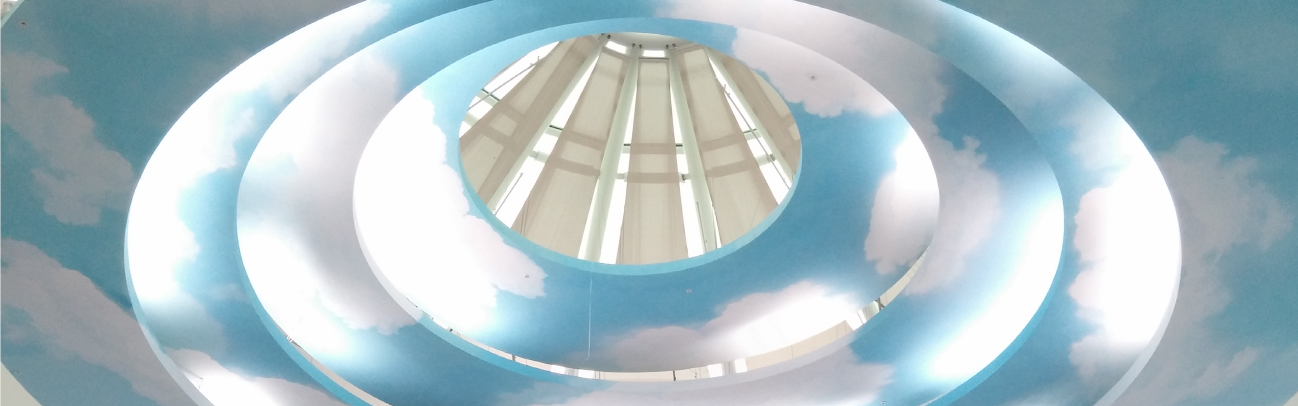삼일 연이어 비가 내렸다. 오월의 문턱을 넘어서면서부터 여름의 기운이 감도는 것이 벌써 여러 해가 되었고 덩달아 이맘때 궂은 비가 부슬거리는 것도 새삼스럽지 않은 일이 되어버렸다. 시어머니의 운명과 장례식까지 고작 삼일이었지만 사흘 내내 비가 내려 눅눅하고 칙칙한 기운이 지하 장례식장에 상주처럼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었다.
고인의 연세 올해로 여든을 조금 넘겼으니 웬만하면 아흔을 넘기고 백수를 누린다는 요즘 어르신들에 비하면 일찍 가셨다 할 수 있겠다. 그래도 환갑을 전후로 암 치레를 한 번 하셨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 후로는 이렇다 할 큰 우환은 없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올 여름 들어서자마자 여느 때 보다 기운이 없으시더니 그저 '노환'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는 병마로 꼬박 보름을 병상에 누워 자식 다섯 남매와 군대에 가있는 손주들까지 줄줄이 챙겨 보시고는 동트기 전 자는 듯이 생을 마감하셨다. 오래 앓다 가신 것도 아니고 크게 앓다 가신 것도 아니고 터무니 없는 사고로 급작스럽게 가신 것도 아니니 남들은 호상이라고 하고 집안 식구도 크게 서러워 하지는 않았다.
집안의 다섯 남매에 한 다리 건너 이종에 고종에 사촌 피붙이들만 다녀가도 사람이 북적거리니 부고를 받고 온 손님들 하나같이 자식농사 하나는 잘 지었다며 큰일 치룰 때는 그래도 식구가 많아야 한다며 한마디 씩들 거든다. 크게 물려받을 재산이 있어 자식들끼리 치고 받는 콩가루 집안도 아니고 번지르한 외제차를 끌고 오는 출세한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업한답시고 없는 재산을 탕진해 먹는 걱정을 끼치는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 고만고만 밥은 먹고 살 만하고 아쉬운 소리는 하지 않으니 남들 빈말이 아니라 이만하면 자식 농사를 영 못지은 집안은 아니었다.
시어머니의 한 평생은 여자로 보면 나름 성공한 삶이었다. 왜정 시대에 나서 나름 학교 교육을 받아 이름 석 자는 쓰고 해방이 되고 나이 스물이 되기 전에 시아버지를 만나 전쟁 통에 먼저 보낸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 마음에 한 서릴 일도 없었을 것이다. 손재주가 좋아 시집을 오기 전 부터도 재봉 일로 친정 살림에 보탬이 되었고 그 기술로 다섯 남매를 다 먹이고 입히고 가르쳤으니 집안 일만 하는 전업 주부도 아니었다. 시아버지는 내가 시집을 올 무렵 돌아가셨던 탓에 기억에는 없고 얘기만 들었는데 면사무소에 오래 계셨다 하니 안팎으로 버는 집이라 크게 어렵지는 않았던 모양이었다.
시어머니는 나름 신여성이었다. 당신이 꾸준히 일을 해왔던 영향도 있었을 것이다. 크게 아들의 역할을 무턱대고 강조하지도 않았고 무리스럽게 자기 것을 챙기지도 않았다. 남편의 다섯 남매 하나같이 독립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이었다.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고 없는 설움때문에 어둡지도 않았고 까칠하거나 모나지도 않았다. 적당한 여유와 적당한 편안함. 나는 남편의 그런 적당함이 좋았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적절한 온도.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들은 내색하지 않아도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묻어나오는 따뜻함이 있었다. 우리 친정도 영 기우는 집은 아니었지만 시댁에 비하면 단촐하고 조금은 서먹서먹한 느낌의 가정이었다. 결혼을 하기로 마음먹고 처음 인사를 드리러 왔을 때 그때 당시 예비 시어머니는 선생님의 인상에 가까웠다. 억지로 상냥한 것도 아니었고 도도하지는 않았지만 누가 함부로 대할만한 만만한 인상은 아니었다. 약간 긴장을 한 탓에 살짝 얼어 있는 내 얼굴을 안경 너머로 슬쩍 지켜보더니 안색이 영 밝지는 않구나. 그래도 눈꼬리가 야무진 것이 살림을 날림으로 하지는 않겠다. 평생 볼 사이인데 미간 찌푸릴 일은 없이 살자. 이 세 마디로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주는 통과의례를 끝내버리는 쿨한 모습을 보여주셨다. 물론 시집이라는 것이 제 집처럼 편하지는 않았겠지만 남의 집안 얘기를 들어보면 나는 상당히 수월한 편에 속했다. 억센 시어머니, 드센 시어머니, 아픈 시어머니가 대부분이라면 우리 시어머니는 좋은 시어머니라 할 수 있었겠다. 당신도 그런 삶을 살았을 것이다. 노름하는 남편, 술먹고 마누라 패는 남편, 계집질 하는 남편이 아닌 가정에 충실하고 자상하다고 까지 할 수는 없어도 주말이면 마당 청소도 하고 묵은 창고 정리를 취미 생활처럼 하는 그런 남편과의 한 평생을 보냈으니 경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편안한 삶을 살았을 것이다. 그런 부모를 보고 자란 다섯 남매가 수월하고 편안한 것이 오히려 상식적이지 않은가. 남편의 다섯 남매의 특징이라면 좌중을 압도하거나 카리스마가 있다고 할 수는 없어도 가끔 술자리에서 노래라도 한자락 시키면 영 내빼지는 않을 정도의 숫기는 있었다. 다들 자기 중심이 잘 잡혀 있고 성실하며 뛰어난 수재는 아니어도 영민해서 공부로 성공한 집안은 아니어도 직장에서 제 한 몫은 톡톡히 하는 그런 사람들. 나는 내 남편 한 사람보다도 이 집안 전체의 이런 분위기가 더 끌렸던 것 같다.
고인의 연세 올해로 여든을 조금 넘겼으니 웬만하면 아흔을 넘기고 백수를 누린다는 요즘 어르신들에 비하면 일찍 가셨다 할 수 있겠다. 그래도 환갑을 전후로 암 치레를 한 번 하셨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 후로는 이렇다 할 큰 우환은 없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올 여름 들어서자마자 여느 때 보다 기운이 없으시더니 그저 '노환'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는 병마로 꼬박 보름을 병상에 누워 자식 다섯 남매와 군대에 가있는 손주들까지 줄줄이 챙겨 보시고는 동트기 전 자는 듯이 생을 마감하셨다. 오래 앓다 가신 것도 아니고 크게 앓다 가신 것도 아니고 터무니 없는 사고로 급작스럽게 가신 것도 아니니 남들은 호상이라고 하고 집안 식구도 크게 서러워 하지는 않았다.
집안의 다섯 남매에 한 다리 건너 이종에 고종에 사촌 피붙이들만 다녀가도 사람이 북적거리니 부고를 받고 온 손님들 하나같이 자식농사 하나는 잘 지었다며 큰일 치룰 때는 그래도 식구가 많아야 한다며 한마디 씩들 거든다. 크게 물려받을 재산이 있어 자식들끼리 치고 받는 콩가루 집안도 아니고 번지르한 외제차를 끌고 오는 출세한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업한답시고 없는 재산을 탕진해 먹는 걱정을 끼치는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 고만고만 밥은 먹고 살 만하고 아쉬운 소리는 하지 않으니 남들 빈말이 아니라 이만하면 자식 농사를 영 못지은 집안은 아니었다.
시어머니의 한 평생은 여자로 보면 나름 성공한 삶이었다. 왜정 시대에 나서 나름 학교 교육을 받아 이름 석 자는 쓰고 해방이 되고 나이 스물이 되기 전에 시아버지를 만나 전쟁 통에 먼저 보낸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 마음에 한 서릴 일도 없었을 것이다. 손재주가 좋아 시집을 오기 전 부터도 재봉 일로 친정 살림에 보탬이 되었고 그 기술로 다섯 남매를 다 먹이고 입히고 가르쳤으니 집안 일만 하는 전업 주부도 아니었다. 시아버지는 내가 시집을 올 무렵 돌아가셨던 탓에 기억에는 없고 얘기만 들었는데 면사무소에 오래 계셨다 하니 안팎으로 버는 집이라 크게 어렵지는 않았던 모양이었다.
시어머니는 나름 신여성이었다. 당신이 꾸준히 일을 해왔던 영향도 있었을 것이다. 크게 아들의 역할을 무턱대고 강조하지도 않았고 무리스럽게 자기 것을 챙기지도 않았다. 남편의 다섯 남매 하나같이 독립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이었다.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고 없는 설움때문에 어둡지도 않았고 까칠하거나 모나지도 않았다. 적당한 여유와 적당한 편안함. 나는 남편의 그런 적당함이 좋았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적절한 온도.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들은 내색하지 않아도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묻어나오는 따뜻함이 있었다. 우리 친정도 영 기우는 집은 아니었지만 시댁에 비하면 단촐하고 조금은 서먹서먹한 느낌의 가정이었다. 결혼을 하기로 마음먹고 처음 인사를 드리러 왔을 때 그때 당시 예비 시어머니는 선생님의 인상에 가까웠다. 억지로 상냥한 것도 아니었고 도도하지는 않았지만 누가 함부로 대할만한 만만한 인상은 아니었다. 약간 긴장을 한 탓에 살짝 얼어 있는 내 얼굴을 안경 너머로 슬쩍 지켜보더니 안색이 영 밝지는 않구나. 그래도 눈꼬리가 야무진 것이 살림을 날림으로 하지는 않겠다. 평생 볼 사이인데 미간 찌푸릴 일은 없이 살자. 이 세 마디로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주는 통과의례를 끝내버리는 쿨한 모습을 보여주셨다. 물론 시집이라는 것이 제 집처럼 편하지는 않았겠지만 남의 집안 얘기를 들어보면 나는 상당히 수월한 편에 속했다. 억센 시어머니, 드센 시어머니, 아픈 시어머니가 대부분이라면 우리 시어머니는 좋은 시어머니라 할 수 있었겠다. 당신도 그런 삶을 살았을 것이다. 노름하는 남편, 술먹고 마누라 패는 남편, 계집질 하는 남편이 아닌 가정에 충실하고 자상하다고 까지 할 수는 없어도 주말이면 마당 청소도 하고 묵은 창고 정리를 취미 생활처럼 하는 그런 남편과의 한 평생을 보냈으니 경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편안한 삶을 살았을 것이다. 그런 부모를 보고 자란 다섯 남매가 수월하고 편안한 것이 오히려 상식적이지 않은가. 남편의 다섯 남매의 특징이라면 좌중을 압도하거나 카리스마가 있다고 할 수는 없어도 가끔 술자리에서 노래라도 한자락 시키면 영 내빼지는 않을 정도의 숫기는 있었다. 다들 자기 중심이 잘 잡혀 있고 성실하며 뛰어난 수재는 아니어도 영민해서 공부로 성공한 집안은 아니어도 직장에서 제 한 몫은 톡톡히 하는 그런 사람들. 나는 내 남편 한 사람보다도 이 집안 전체의 이런 분위기가 더 끌렸던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