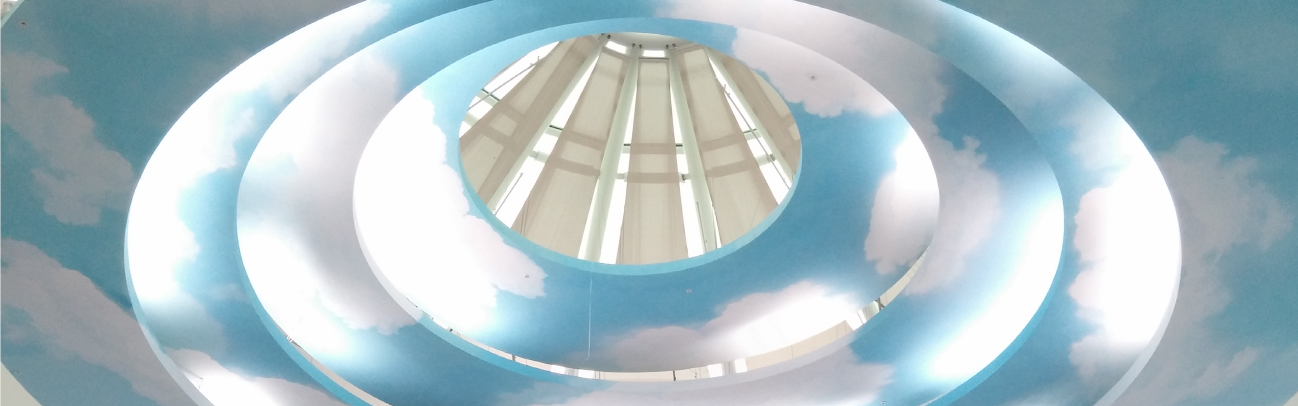지난 수요일 글쓰기 시간의 주제는 '몸'이었다.
나는 사정이 있어 수업을 한시간이나 지각하였고, 덕분에 함께보는 영상도 못보고, 글도 못쓰고 앉아서 다른 수강생들이 쓴 글을 듣다가 왔다.
수업이 끝난 후 파격적인 폭탄머리를 한 선생님이 덜컥 두 손으로 팔을 부여 잡으며 꼭 글을 쓰라 하셨는데, 마치 '다음 주까지 안쓰면 절대 안되!!' 라고 말씀하시는 듯 했다. 험험. 그럼... 나는 절대 자발적이지 않은 인간이니까.
<이 이야기는 머릿 속어딘가에 있는 실제 있었던 일인지 아닌지도 이제는 잘 모르겠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곳은 낮에는 햇살이 따갑고 아침저녁으로는 쌀쌀했으며, 밤에는 추웠다.
나 같은 인간은 아침저녁으로 한기를 느끼고, 잠자리에 들어서는 손발을 싹싹 비벼가며 추위를 달래야 했다.
챙겨간 수면양말을 신고서도 발은 시렸고. 잠자리에 누워서도 장갑은 끼고 있었다.
살짝 잠이 들라치면 코끝이 시려 잠을 깨고, 그때부터는 머리 정수리부터 내려오는 냉기에 환장한다.
이가 악물리고 턱이 오돌오돌 떨리는 유난히 추운 그 곳의 밤.
낮에는 또 정수리끝으로 해가 떨어져 머리가 딩할 정도로 덥고 찐다.
특히 산에서 보낸 8일은 극단적인 추위와 더위가 교차했다.
내 손발을 내가 잘라내고 싶다는 잔인한 생각마저 들었던 그 때.
그 곳에서 나와 또옥같은 인간을 하나 발견한다.
나처럼 손발이 시려워 한눈에 봐도 냉기에 대한 두려움이 얼굴에 묻어나는 인간. 신기한 일이다.
나는 어른스럽게 나보다 더 가련한 인간에게 머플러며, 여분의 수면양말이며, 심지어는 하나밖에 없는 오리털 자켓까지 기꺼이 대여한다.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그 인간보다 내가 더 추웠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감각이란 참 오묘한 것이다.
사실 손발이 유난히 시려운 것 빼고는 나와 같을 것은 없는 인간이었다.
키는 나보다 적어도 20cm 이상 컸을 것이고,
어깨도 나보다 배는 넓었을 것이고,
손발의 면적도 나보다 넓었을 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부처님처럼 허리가 길어 앉아 있는 것이 돋보이는 그런 인간이었다.
두 눈도 길고 가늘게 갈라졌고, 얼굴도 요즘 아이들처럼 뾰족하지 않은 것이 영락없는 부처님의 모습이다.
또 모르지. 내가 보고싶은 대로 보고, 기억하고 싶은대로 기억하는 것일지도 모르지.
8일만에 무사히 산에서 내려와 그 다음날은 완전히 털썩 풀어졌다.
세상에서 가장 여유로운 아침이었다.
짐 하나 짊어지지 않고, 머리칼도 다 날려버린 채 가장 가벼운 아침과 오전을 만끽한다.
짐을 챙기다 문득 중요한 물건이 하나 없어졌음을 발견했다.
이 곳에서는 밤에 돌아댕기려면 꼬옥 필요한 물건. 헤드랜턴.
도대체 어디로 간걸까.
이런저런 여차저차한 이유로 그 얄미운 인간의 소행이 틀림없음을 확신한다.
이미 빈털털이가 된 상태라 새로 사기에는 고가의 물건이니.... 찾으러 갈 수 밖에..
그 인간의 방은 1층이지만 창문으로 짜악- 볕이 따뜻하게 들어온다.
2층이었던 내 방보다 볕이 잘 드는 마음에 드는 방이다.
며칠동안의 산생활로 몸도 마음도 지쳐버린 여름도 봄도 가을도 겨울도 아닌 어느 날 오후.
나는 잠시 햇볕을 쬐기로 한다.
두런두런 별로 영양가 없는 이야기를 주고 받는다.
몸도 마음도 지쳤으니 서서 이야기 하는 것이 더 어설프다.
두 인간은 각자가 원하는 방향대로 누워서 휴식을 취한다.
절대 에로틱하지도, 로맨틱하지도 않은 그 너저분함이란......
이 두 인간의 공통점은 손발이 차다는 거였지.
손을 잡는건 언제 어디서도 참 민망한 일이다.
그럴 일은 없다.
하지만 두 인간은 온기가 필요했고, 어쩌면 냄새가 날지도, 무좀이 있을지도 모르는 그 발을 포개고 각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누워 휴식을 취한다.
다시 생각해봐도 절대 에로틱하지도, 로맨틱하지도 않은 상황이다.
마치 시계바늘과 같이 하나의 축으로 누워 있는 두 인간.
시계바늘도 한시간에 한번은 만나고 마니, 살짜쿵 돌다 한 번 쯤은 만나도 좋겠지.
째깍. 째깍. 시계바늘 소리와 거의 비슷한 속도로 뛰는 심장.
쿵-
쿵-
쿵-
쿵-
나는 그 어느때보다도 편안한 휴식을 취한다. 엄마 품에 안긴 어린 아이처럼 올곧이 편안한 휴식을 취한다.
얼음장같은 손가락은 심장박동을 따라 까딱, 까딱, 까딱, 까딱.
이런 건전한 휴식은 참으로 처음이다. 편안하다.
그 무덤덤한 인간의 손가락은 이미 말라 비틀어질대로 말라버린 나의 갈비뼈에 가지런히 올라가 계이름을 배우듯 까딱까딱 한다.
'신기하다, 몸에 살이 하나도 없네'
그래. 나도 신기하다. 명치 끝까지 말라버려 이제는 몸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종로바닥을 싸돌아다녀도 아무런 부끄럼도 없을 법하게 변형된 내 몸이 나도 신기하다.
문득, 생각이 많아 머리가 뜨거우면 손발이 차다는 어느 선배님의 말씀이 떠올라 대략 한달은 넘게 다듬지 않은 머리칼 속으로 손윽 쓰윽 밀어 넣는다.
역시 따뜻하다. 머리칼은 옷감과는 다른 온기가 있다. 하지만 생각이 많아서 머리가 뜨거운지, 원래 머리는 따뜻한지 모를 일이다.
하지만 더 이상의 진도는 나가지 않았다. 이런저런 여차저차한 이유로 그냥 입맛을 잃어버렸고,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공연히 상심했다.
감각은 기억을 만들고, 기억은 고통을 만들고, 고통은 있는 그대로 괴롭다.
나는 내 몸이 감각하는 것을 증오한다. 혐오한다.
눈에 보이지도, 지금 현재 존재하지 않는 그 개같은 감각이 가증스럽다.
지금의 이 부정적인 느낌은 아쉬움일까. 허무함일까. 소외감일까. 뭘까.
이제는 그냥 휘익, 날라가버려라. 휘익.
<있었을지도 없었을지도 모르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 끝>
'한기'에 해당되는 글 1건
- 2011.07.11 몸 4